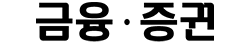상상해보자. 부도가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 전 한 연예인이 파산의 아이콘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다. 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에휴. 저는 부도가 나면 바로 감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바로 감옥행으로 가는 것일까? 결론은 이렇다. 아니다.일단, 휴대폰이 불이 난다.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은행은 물론, 거래처로부터, 그리고 크고 작은 회사 관계자들은모두다 연락이 온다. 그리고 묻는다.
“내가 들은 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다음 벌어지는 일.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내가 속한 회사에 들어 갈 때도,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거래처를 갈 때도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말할 수 있다. 바로 ‘직원’들이라고.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몸 바쳐 일하던 회사가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부도를 맞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우선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 이번 달에 나가야 할 아이들의 학원비와 공과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아니면 사채라도 빌려야 하는 건지 막막할 것이다. 답답할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매일 점심을 함께 나눈 직원들 앞에서 차마 ‘부도’의 위기에 있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표정을 숨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나의 감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만한 행동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의지에서 그랬던 것이다. 매번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 느끼던 어려움들이 당연히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 했다.
오히려 그것이 직원들에게는 커다란 배신으로 느껴질 줄이야. 물론, 회사 내적으로는 빡빡한 경영상태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부도가 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았기에 처음 ‘부도’소식을 들었을 때, 직원들은 혹시나 뒤로 재산을 빼돌리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려는 시선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한 부도사태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합쳐 타개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직원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몫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니, 답은 명확했다. 잘못은 바로 ‘나’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나를 믿어주고 따라만 와주면 하고 호소하고 싶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의장 밖으로 맴맴맴메...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목청껏 소리 높여 소리칠 수 있는 매미의 여유로움이 부러웠다. 개인 재산 모두에 보증을 섰다는 점을 이미 직원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근무했던 그 성실함을 직원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30년 간의 모든 신뢰감도 ‘부도’라는 먹물 앞에 다 지워져버렸다.
사실 거래처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내부 직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 힘들었다. 맴매매매.. 하는 매미울음 위로 “중고 가전 삽니다. 컴퓨터, 오디오, 중고 가전삽니다”라는 확성기를 틀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아저씨의 목소리도 겹쳐졌다. 영혼 없이 반복해서 울리는 목소리가 오히려 달콤하게 들렸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이었다. 스크린 도어 사이로 오늘 하루 만났던 많은 직원들, 거래처 분들, 그리고 수많은 문자들이 스쳐갔다. 지하철의 빠른 소음 사이로 내 자신을 싣고 싶었다. 저 굉음 사이에 내 몸을 날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 스크린 도어에 새겨져있는 시 한편이 눈에 들어왔다.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였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 정호승 <바닥에 대하여>
어쩌면 나는 바닥을 아직 가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향해 가는 길이 두려웠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직원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인생의 바닥을 찍는 순간, 그것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무서웠다. 지하철을 나오자, 여전히 더운 기운은 얼굴을 엎쳤고, 매미는 맴맴맴매.. 하며 울었다. 그러나 그 매미 소리는 곧 내가 우는 소리였다. 나는 묻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고. 나는 울고 있었다. 나의 바닥은 어디냐고. 혹시나, 바닥에 닿으면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