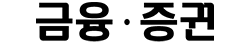그날 나는 울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만 원짜리 달랑 한 장이 있었다. 택시의 미터기는 벌써 1만 3천 원을 가리켰다. 몇 분 간격으로 금액은 올라갔다. 강변북로에 접어든 택시를 중간에 내려달라고 기사님께 말씀드릴까, 머뭇거렸다.
절두산 성지. 회사가 부도가 난 뒤, 나는 울적해지는 일이 생기면 무작정 여기를 찾아가곤 했다. 매번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지만, 더 이상 운전도 못할 정도로 차 정비를 하지 않은 탓에 무작정 택시를 탔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종합검진마저 받을 만큼의 여윳돈조차 없었다.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어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시기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택시 안에서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버렸다. 그날, 그토록 기다렸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는 날이었다. 법무법인 담당자는 자기가 맡았던 수 십 건의 사건 중에 개시결정이 안 나온 적은 없다며 걱정 말라했다. 결과는 기각.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모자라, 어렵게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도 기각이라니.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부도가 난 뒤, 가장 어려웠던 일 중의 하나는 직원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었다. 발 빠른 일부 직원들은 이미 이직했다. 나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명 한 명 직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한번만 다시 일해보자고.
그리고 회사는 법무법인 수임료를 어렵사리 지불했다. 현금보유율이 적었기에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다. 그렇게 설득하기를 수 십 차례. 십시일반으로 다시 공장을 돌렸다. 일부였지만, 몇몇의 영업부 직원들도 다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기업회생에 동참했다. 그들에게는 일터이자, 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밥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달랜지 한 달. 직원 모두는 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았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가장 첫 관문인 개시결정. 그러나, 회사는 이 문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기업회생조차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다들 절망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공고가 예정되어있던 날. 나는 이 소식을 법원에 가서 직접 듣고자했다. 법무법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했지만, 나는 기업회생의 첫 관문을 직접 맞이하고 싶었다. 부도가 나고 낮아져만 가는 자존감을 그나마 개시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었나보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달리, 개시결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기각 소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자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다. 법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거울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는 우리 회사의 회생사건을 맡았던 판사님도 계셨을 것이리라. 아니, 나의 우는 모습을 보고 계시길 바랬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리라.
결국, 결과를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하지 못한 채, 나는 그 길로 절두산을 향했다. 절두산은 나의 멘토이자 스승이셨던 구본형 선생님의 유해가 모셔져있는 곳이다. 절두산(切頭山). 즉 ‘머리를 자르는 산’ 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1866년의 병인박해에 그 유래가 있다고 한다. 병인박해 때 흥선대원군은 가톨릭 신자들을 잡아다 처형했는데, 바로 이 산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을 시행했기에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은 가톨릭 성당과 순교박물관, 그리고 ‘부활의 집’이라고 불리는 유해안치실이 조성되어있다. 이곳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 장소로, 방문만 해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음미하게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조성되어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 고통과 행복의 문제들을 고민하다보면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축소되어 보인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는 다 사소한 일인데 뭐.’ 라고 정리하게 해주는 장소이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기업회생 기각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라는 따스한 위로. 또 다른 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진심어린 위로. 뭐 까짓것 다시 시도해도 괜찮아, 라는 덤덤한 위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엉엉 소리를 내어 우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사 아저씨에게 부족한 택시요금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되었다. 부도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파 밥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 스며들어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바라보시더니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의 볼륨을 줄여주셨다. 그리고 몇 미터를 가서 꺼버리셨다. 각자의 사연이 담긴 편지들을 듣기에 나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 수도 있겠다. 양희은과 강석우의 사연으로 가득 찼던 택시의 공간은 이내 나의 울음소리로 채워졌다. 택시의 좁은 공간을 상대로 연극의 모노로그와 같이 분출된 나의 울음도 스르르 잦아들었다.
절두산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영수증 뒷면에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해드리겠다고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기사 분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흔쾌히 그러라,고 답변하셨다.
그날. 나는 구본형 선생님의 납골당 앞에서 또 한 번 통곡했다. 그러나 이 눈물은 그저 기업회생의 개시결정이 기각 된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다. 다만 절두산으로 가달라던 승객의 울음에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를 희생하고 조용히 꺼주신 택시 기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해진 ‘감사의 기도’였다. 기업회생의 제도권 안에 들 기회마저 박탈당한 나에게 위로를 건네주던 아저씨의 잔잔한 위로가 ‘감사’로 바뀌었던 것이다.
후에 기업회생이 종결되고, 성공적으로 M&A에 이르게 된 어느 날, 나는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단편소설을 접하게 되었다.
주인공인 빵집주인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를 만난다. 그리고 그들을 빵집 안으로 들여 갓 구워낸 빵을 건넨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죠.” 하면서. 그는 말한다. “롤빵을 좀 드시지요.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라고. 그는 부부가 빵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 롤빵은 따스하고 달콤하게 그들의 슬픔을 달래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위로한다. 작지만, 가슴 따뜻한 손을 건네는 주인공의 행동은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전달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제목으로 소설가 김연수가 번역한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의 원제목은 〈A Small, Good Thing〉이다.
가슴 저미는 사연들을 읽어주던 라디오를 조용히 꺼 주시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택시 아저씨의 손길, 미처 택시 요금을 준비하지 못한 승객에게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라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여준 그 어르신의 위로에, 나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내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곧장 바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되었음을 전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 자신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했다.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지만 좋은 일들은(a small, good thing)은 결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커다란 위로이다. 나는 믿는다. 힘들 때 라디오가 꺼진 조용한 택시안의 공기와 며칠이 지난 후에 택시 요금을 송금할 여유를 주셨던 그 기사 아저씨의 위로가 기업회생을 종결하게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일이었다고.
*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단편소설은 《대성당》(문학동네, 2014)의 다섯 번째 작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재엽 (주)아이메디신 이사. 금수저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닥쳐온 가족 기업의 부도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남다른 감수성으로 일과 생활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칼럼 <낭만적 기업회생 이야기>는 경영일선에서 만난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문학과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그의 행보이다. 저서로 <파산수업>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이 있다. j.chung@hanmail.net